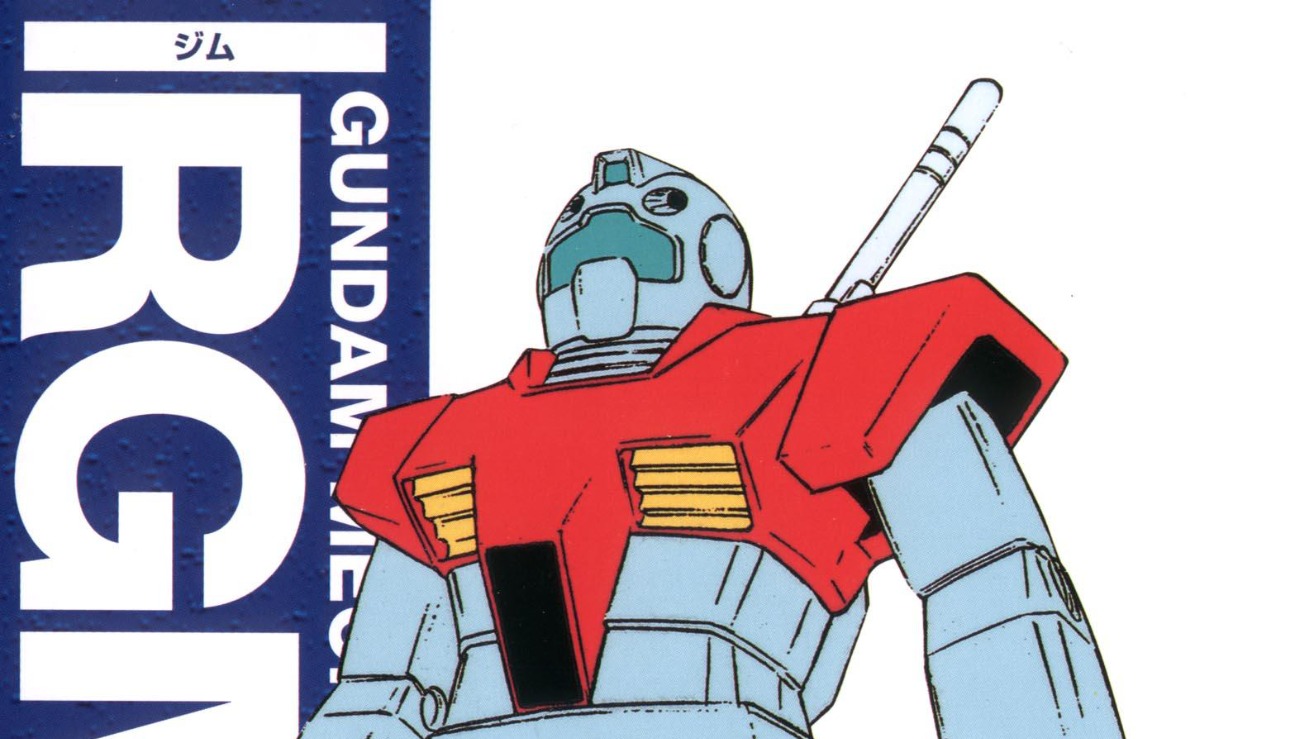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왜 우리는 욕먹어가며 자국사를 공부한 것일까? 본문
한참 전에 대학원은 다른과로 가서 박사를 받은 선배가
고구려사를 전공하기로 했다하니
민족의 영광을 위해…(이하 생략)… 이런 식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얘기라 짜증낼만도 했지만
원체 순수하게 사는 양반이고, 또 나름 좋아하는 선배라 그냥 실실 웃고 넘어간 기억이 있다.
어렷을 때는 환빠였던 시절이 있었지만 오늘의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르르 떠는 19세.
요즘에야 많이 부드러워져서 그냥 넘어가는 일도 많지만
민족의 영광을 위해 복무하라는 말을 들으면 그다지 기쁘지 아니하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이바닥 사람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정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그닥 기억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
1970년대는 민족사학 논란에 1980년대는 국사교과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해야겠지만
거의 일반적으로 학계가 두들겨 맞았던 기나긴 역사가 있다.
군사정권 하에서 아무래도 미약한 정통성을 역사로 보강하려는 의도가 컸고
암울했던 20세기의 전반 덕분에 약간의 강박관념에 걸린 시대를 이해한다.
바다 밖에선 서로 냉전의 공포 속에 살아야 했지만
냉전의 최첨단에선 잃어버린 36년의 그림자까지도 같이 짊어져야 했으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해도 어쩔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기들만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와 다르다고 식민사관의 후예라느니
척결대상이라느니 비난하고 괴롭히는 것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기서 낙인찍히고 고난을 당한 분들의 대다수는 돌아가시고
몇 분 남지 않을만큼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앙금은 남아있다.
정신적 외상을 깊게 입은 학계는 대중과의 호흡을 중단하다시피 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모욕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뭐 어떤 분은 이 때의 충격이 건강을 헤쳐 이른 나이에 돌아가신 거 아니냔 소리도 나온다)
정문연(요즘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 한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우르르 몰려온 그쪽 인사들에게 (말로) 난도질을 당하고
언론에서는 국사바로세우기라며 난리부르스를 치는데
그때 기록을 읽다보면 이 분들 정말 자결안하신 게 다행이지 싶을 정도다.
(정문연에서 개최한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세미나 단행본 뒤에 실린 속기록을 보면 눈물난다)
자기들은 민족사를 바로 세운다는데 70년대 내세운 ‘웅비’라는 표어는
1930, 30년대 일보의 관동군이 만주와 중국 쳐들어갈 때 사용하던 용어고
80년대에 국회다 뭐다 끌고다니며 죄인취급한 건
1940년대 쓰다 소오기치가 일본서기의 초기기록에 대해 회의적이란 이유로
재판정에 세운 것을 보는 것 같다.
민족의 빛나는 얼은 바로 파시즘을 말하는 것인가?
며칠전 ‘김부식과 일연은 왜’란 책 초반에서 멘붕한 오후에
중고서점에서 지금은 절판된 윤종영의 국사교과서 파동(혜안)을 구했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 실무진으로 보냈던 저자의 회고담을 읽다보니
한동안 읽지 않다가 어제 밤에 펴보니 그동안 알던 것보다 더 끔찍했더만.
아직도 민족의 역사는 휘황찬란한 것이었다는 사람들이 많다.
이젠 인터넷 역사학이라고 할만한(실은 동인지에 가까운)
전혀 다른 유사역사학이 자리 잡히기까지 했다.
다른 것은 왕년의 재야의 국수주의 계열은 사료의 해석이야 어떻게 하든 읽기라도 했는데
지금은 안읽고 상상력을 극대화 한다는 것.(솔까말 공부의 질은 후퇴했다)
그리고 권력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
(80년대까지는 유력한 정치인이 뒤에 서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고대사이야기 > 고대사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백성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19) | 2012.09.23 |
|---|---|
| 고대 삼국의 흥망성쇠를 도표로 만드는 바보짓.. (2) | 2012.09.14 |
| 지나친 강조는 없느니만 못하다.. (6) | 2012.08.21 |
| 학자들은 그렇게 깐깐하지. 그게 종특이야. (12) | 2012.07.31 |
| 민족의 영광 보자고 할 말 안할 말 자제염.. (15) | 201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