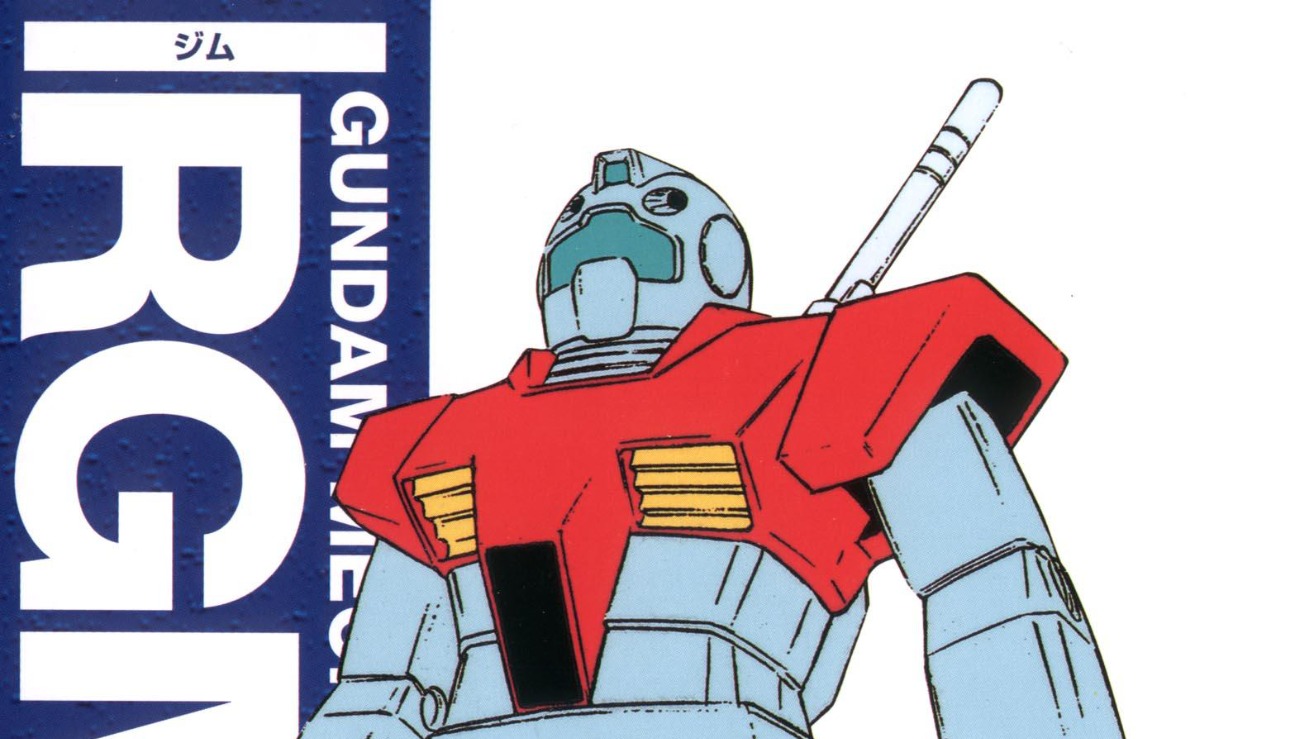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대안탑과 장한가.. 본문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서안과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이 탑을 보노라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안에서 진시황의 병마용갱과 대안탑은 보고 싶었습니다.
북경은 그닥 관심이 없었구요.
선진시대 연의 수도로서, 혹은 위진남북조시대의 계라는 도시라면 모를까
명청이야 그닥인 것은 전공상 어쩔 수 없군요.
서안에서 가장 기대한 것은 대안탑이었습니다.
옛 장안의 랜드마크 구실을 했던 건축물인 그 것을
신라의 사신들이나 끌려왔던 고구려인들이나 백제인이라면 누구나 보았겠지요.
지금 서안보다 더 큰 옛 장안의 흔적을 알려주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6752년에 삼장으로 유명한 현장이 인도에서 귀국하여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번역하고 제자들을 기른 자은사에 세워진 탑입니다.
고종이 어머니를 위해 지었다고 하는군요.
여기엔 불경을 보관하는 기능도 있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본 대안탑입니다.
마침 서안에 들렀던 이틀간은 비도 내려서 더위가 많이 수그러든 상태였습니다.
북경에 가서야 더위에 고생을 하게 되지요.
적당히 촉촉한 분위기의 대안탑은 기묘한 흥취를 자아내더군요.
漢國山河在 한나라는 산하만이 남아있고,
秦陵草木深 진시황무덤엔 초목만 무성하다.
暮雲千里色 천리에 뻗친 저물녘 풍경,
無處不傷心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곳 없네.
- 題慈恩塔 자은사탑에 붙여, 형숙
만당기의 시인 형숙의 시입니다
진한의 유적들을 둘러보며 시인은 망국의 자취를 느끼는데
이를 천년 뒤에 둘러보는 후인들은 당의 영화도 흔적 없음에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마침 주말이라 둘러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걸맞지 않게 설치된 화면에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나오는 영상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하기야 현장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는 서유기에 근거한 이미지일테니
장사를 하려면 그 서유기의 무대라고 선전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만 기분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이 자은사는 단지 당의 중요한 절이고, 현장이 새로운 불교를 일으킨 현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도 인연이 깊은 절이기도 합니다.
현장의 제자, 신라인 원측과 관련이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15세에 당으로 건너간 왕족 원측은 현장이 돌아오자 그의 제자 중 한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장이 중국인 제자 규기를 가장 총애하여 그에게만 가장 중요한 교리를 전수하려 하자
원측은 몰래 숨어들어 비밀과외를 도강하지요.
나중에 서명사로 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바로 그 원측이 처음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어느 곳에서 원측이 도강을 하였는가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북과 종을 놓는 자리. 우리와 달리 철통같은 보호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절이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같은 느낌의 향로.
너구리잡는다거나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이 집단으로 담배를 태울때나 볼 수 있는 연막을 형성합니다.
슬슬 대안탑의 모습이 가까워집니다.
멀더요원만 저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벽을 넘으면 대안탑을 더 가까이 볼 수 있습니다.
대안탑은 천년을 넘게 이 도시를 내려다 보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원래 탑만 보면 환장을 하는 성격이라 탑의 사진을 많이 찍는 편입니다.
예전에 36장 필름을 순식간에 써버리는데
항상 찍다보면 올려다보는 로우컷이 많지요.
치마입은 아가씨를 찍으면 ㅂㅌ소리 듣기 십상이겠지만 탑은 관대합니다.
이 날도 정신없이 찍다 메모리가 꽉차서 정작 아주 가까이 갔을 때는 찍지도 못했습니다.
경내에서 노트북을 꺼내 메모리를 옮기려는데 시간이 끝나 울먹울먹 했습니다.
언젠가 여기 다시오면 공국군의 모 소령처럼 '대안탑이여, 내가 돌아왔다'고 외쳐야 하겠지요.
이 탑을 보노라니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탑면에 표현된 목조건물의 특징이었지요.
바로 빨간 선 안을 주목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니 낯익은 것인가요?
우리나라의 석탑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탑면에 목조건물의 가구(지붕의 무게를 이기기 위한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석탑이나 전탑에서 이런 구조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저거 없이 매끈하게 짓는다고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얼핏 보면 쓸데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탑의 건축학적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전자적인 흔적인 것입니다.
대안탑이나 우리나라의 석탑은 목탑에 있다는 것이지요.
목탑을 더 간략하게 만드는 과정, 즉 아이콘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는 필요없는 가구의 흔적을 여기에 남겨놓은 것이랄까요.
미륵사지 석탑처럼 돌을 나무처럼 부품을 깎아 조립하는 단계에서
더 간단한 형태를 추구하는 와중에 물질적인 특성은 상당히 잘라졌지만
여전히 옛 형태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약간 기울었다고 하는데 정말 기울었습니다.
대안탑은 또하나의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당의 과거에서 급제한 사람들만이 이 탑에 자기의 이름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종과 양귀비와의 로맨스(라쓰고 불륜이라 읽는다)를 다룬 장한가의 작가
백거이가 최연소 합격자로 이 탑에 이름을 새겨놓았다 하더군요.
백거이가 유명해지자 신라의 귀족들도 그의 시를 얻기를 갈구하여
그의 신작시가 나오면 바로 적어 경주로 보내도록 고용된 자도 있었다 하니
그의 인기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죠.
이제는 잘 안쓰는 말이지만 '장안의 종이값을 올렸다'는 말을 들을만 합니다.
비록 쇠퇴기에 접어들긴 하지만 이후에 장안을 찾는 신라인들은
백거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이 탑을 찾아 그의 이름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가수를 만난 중딩처럼 어쩔 줄 몰라하는 광경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니 대안탑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대안탑은 아니었고 양귀비가 훌러덩하고 놀았다는 화청지에서 발견한
모택동이 썼다는 장한가의 시비입니다.
사실 일정탓에 진득하게 볼 수 없이 주마간산으로 지나쳐버려 아쉬움이 더한 대안탑,
나중에 긴 호흡을 갖고 여기에 들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장안이여, 내가 돌아왔다'라는 대사는 날려야겠지요.
※ 시의 번역은 임창순 선생의 『당시정해』(소나무)에서 따왔음을 밝힙니다.
'한국고대사이야기 > 자료로 보는 고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몽촌토성 풍경.. (2) | 2010.11.18 |
|---|---|
| 정창원전과 함께하는 일본여행 1023 - 오사카에 도착하다.. (0) | 2010.11.13 |
| 횡성 중금리의 신라석탑 (0) | 2009.10.27 |
| 듕궉여행 후기 5 : 8월 25일 3일째 1 (2) | 2009.09.16 |
| 듕궉여행 후기 4 : 8월 24일 둘째 날3 (6) | 2009.09.1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