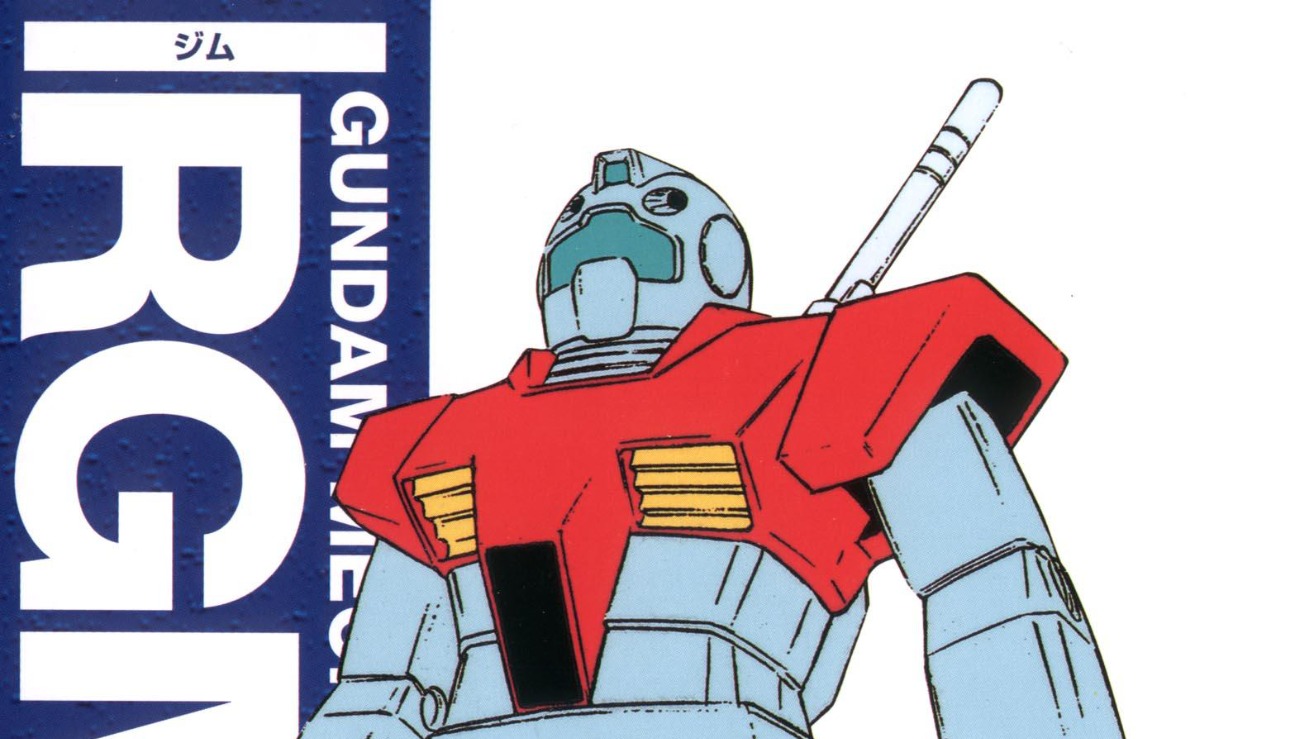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고대사연구에서 중국과 일본을 눈여겨 봐야할 이유.. 본문
"자료가 없다"
한국고대사만 그런 소릴 하는 게 아니다.
어느 나라던 고대사 전공자는 저 말을 달고 산다.
문자 자료가 넘치는 중국과 로마도, 약간 적당히 있는 우리도,
문자가 없이 극소수의 고고자료에 의지해야하는 어떤 나라도
고대사 전공자에게 자료가 부족하단 말은 만국 공통어다.
아마, 역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모든 언어로
저 문구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고대사 전공자는 굉장한 천재거나 바보임에 틀임 없다는 말이 있으랴.
(아마 범인은 중세 이후 전공자일 것이다. 위 말도 만국 공통어다)
석사논문을 쓰고나니 구비문학을 전공하는 다른과 선배가
'거짓부렁은 내전공인줄 알았더니 니가 진짜 거짓부렁하는구나'란 말을 했다.
이건 국문학도들이 고대사전공자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찬사라고 생각한다.
하긴 맞는 말이다.
고고학을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고대사 전공자들이 매우 많다.
문자자료가 제한된 면에서 고고학 자료가 매우 중요함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만 가지고서는 문자기록의 함축성이나 행간에 가려진 부분이 쉬이 읽히진 않는다.
간혹 고고학 없으면 고대사 연구가 죽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쪽 전공자들이 보이는데
토층이 얕아 전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뒷시대에 쉽게 손상되는 한국에서
어찌보면 그건 슬픔 가득한 살아남은 유적이기도 하다.(고고학에선 그걸 교란이라 부른다)
실제로 강원도 영서에선 삼국시대 주거랑 조선시대 주거가 겹친다.
지금은 아파트 촌이 된 춘천의 칠전동에서도 청동기유적 확인하는데 판 트렌치가 고작 무릎 높이였다.
은나라 유적을 기대하고 10미터를 파니 송나라 관아건물이 나왔다는 중국이 아니다.
(일설에는 고 장광식 선생이 삽을 던지며 '에이 1*, 나 안해'라고 했다는 후문도 들려온다)
어차피 고고학적 자료도 반토막이긴 매한가지다.
몇년전까지도 삼국시대에 메몰되었다는 소릴 들어도
중국사료나 연구서는 꾸준히 봤다.(물론 번역된 걸루)
하지만 동아시아를 한 눈에 조감하기 시작한 건
나라박물관에서 열리는 정창원전을 처음 갔을 때다.
그리고 서안에 가서 대안탑을 보며 뭔가 이빨 빠진 것들을 서로 채워갈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본애들이 전후에 벌였던 동아시아 세계론 구축과는 다른
동아시아문화권이 어떻게 굴러가는 문명권이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사료야 중국의 사료가 압도적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적은 의외로 적다.
하다못해 무슨 물건을 썼는지는 일본을 보면 된다.
중국에서는 벽화에만 남은 것들이 실물로 잘 남아있더라.
사실 우리가 제일 적게 남은 것 같았는데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균형은 지정학적 위치만 그런 게 아니다.
경주를 갈 때마다 그것을 실감한다.
나라와 장안에서 볼 수 없는 게 경주엔 널렸다.
꼭 동아시아문화권처럼 거창한 것을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의 기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처음엔 고구려의 관등 시스템을 공부하다 중국과의 비교한 기록이 있어서
당육전과 수서, 구당서, 신당서의 백관지를 보는 중인데
이것을 보다보니 신라의 관직 시스템이 좀 더 잘 보이기 시작했다.
다들, 중국기록은 동이전만 보고 넘어가던데
사실 집사부나 다른 기관들이 령, 경(시랑), 대사(낭중), 사지(원외랑), 사 등의
5단계 직급체계를 갖추는데
과연 그들이 각각 뭘 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가졌다.
왜? 삼국사기엔 각각의 직급이 어떤 관등에 대응하는지만 나왔으니까.
그 기록을 썼던 당시에는 중국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니까
굳이 여기에 중복서술 안해도 다들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우리는 그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떨어지는 와중에 이웃 자료들도 안봤다.
제도사다 정치사는 너무 많이 했으니 진부하다란 말은 다들 하지만
진짜 봐야할 걸 안봤으니 할 수 있는 얘기에 진척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전에 어느 친구의 발표에 번역된 중국사 책이 인용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다.
삼국시대 율령시스템이 어떤 모습이었고, 또 어떻게 실현되었는가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정작 한국에서 나온 율령관련 글이 많지 않다.
올 초에 서울대에서 나온 박사논문까지 몇 편 없고, 논문도 약간,
고고학적으로 다룬 책 한 권 더 할 수 있다.
지난 가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했었던 '문자 그 이후' 전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일본의 비석들과 마을에 걸어놓은 생활규칙을 담은 목판이었다.
신라의 촌락문서에 보이는 사회규제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였다.
(뭐, 광개토왕릉비의 수곡선생 소장본이 나온 것도 충격과 공포였지만, 그건 또 다른 얘기)
한국사 자료만으로는 빠져있는 것들을 이렇게나 구체적인 실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무비판적으로 같이 놓고 본다는 건 아니다.
중국에서도 제도가 법대로 이루어지진 않았고,
일본이 중국시스템에 가깝게 가려고 무척 노력했으나 실제론 허상이었다.
(7세기에 제기한 농지확보안이 메이지시대에 와서야 가능했다)
신라는 노골적으로 중국을 따라한 것 같으면서도
자기 색깔은 그대로 유지시킨 특색이 있다.
어느 정도 숙력된 전공자라면 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위 그림은 평성경이 존재하던 시기에 일본의 신분계급에 따른 집의 규모를 보여주는 것인데
문자기록으로만 남은 골품제에 따른 규제 기록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기록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를 실감하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자료의 양 이야기로 돌아가서
고고학자료나 중국과 일본의 연구서를 제외하고나면
대학의 선생님들이나 학부생이나 가진 문헌자료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이전기록, 금석문.. 끝!
한국고대사 연구도 반세기는 지난 터라 어지간한 부분은 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젠 좀 더 시야를 넓혀서 행간의 의미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한국고대사이야기 > 고대사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료를 꼼꼼히 읽는 것.. (2) | 2012.05.14 |
|---|---|
| 2012년은 율령연구의 해?? (4) | 2012.04.30 |
| 상태사시중장으로 고구려 군사제도를 가늠하지 마세요.. (16) | 2012.04.16 |
| 강남에서 이구년을, 당성에서 악사를.. (0) | 2012.01.17 |
| 삼국시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2) | 2011.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