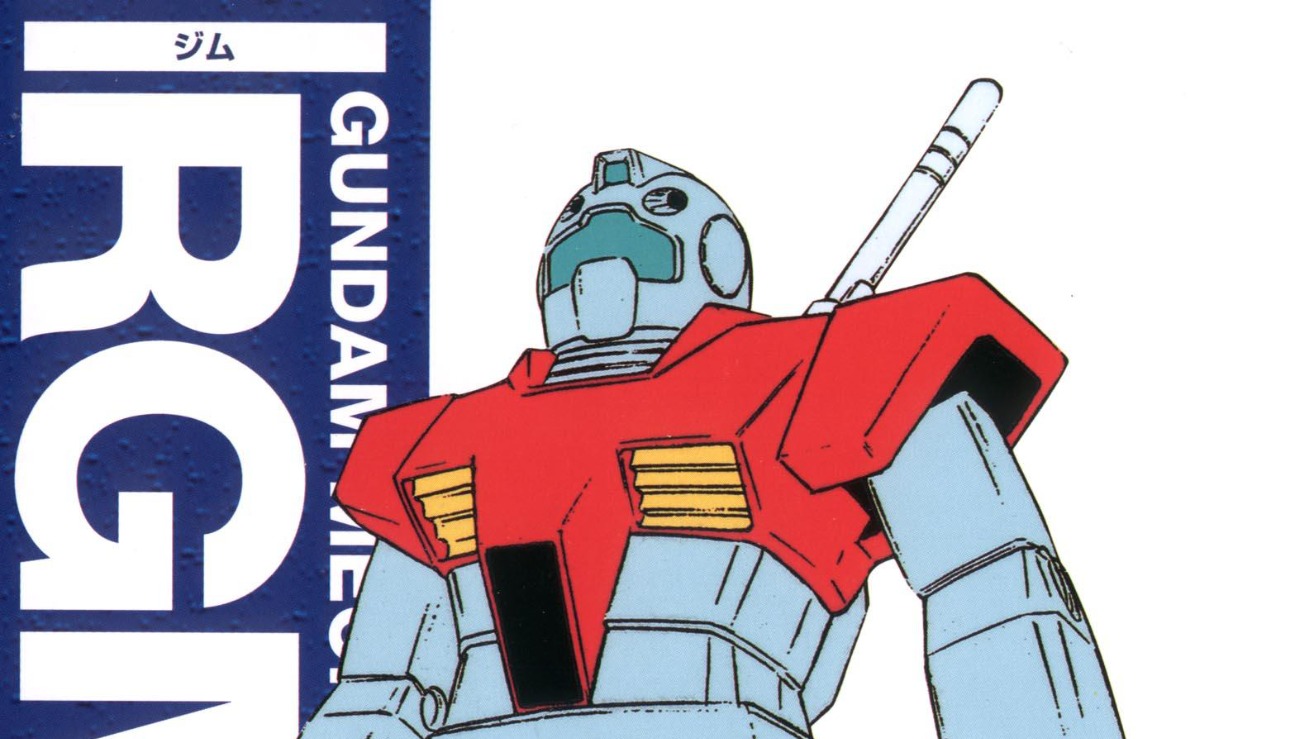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003. 아빠, 이제 휴일 없어? 본문
지난주에 한가한 아버지 얘기를 했으니 이번엔 노동에 찌든 아버지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살던대로 여기저기 떠돌며 편하게 과일이나 따먹고, 작은 동물을 잡고 사는 건
인류 고유의 전통(?)이자 태생적으로 가장 친숙한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날씨가 꼬이면 온가족이 쫄쫄 굶어야 하는 고통이 따랐습니다.
견과류를 비축하는 다람쥐의 지혜를 이 땅에 되살릴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들이 주로 먹는 과일이나 고기를 잔뜩 보관할 수는 없었죠.
요즘처럼 냉동보관이라던가 통조림, 진공포장, 동결건조와 같은 수단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꾸준하게 잡혀주고, 열려주었으면 좋으련만
이상하게 너무 추워 얼어버리는 나날이 오고, 갑자기 춥거나 덥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번쩍하는 빛이 땅으로 내리꽃히며 굉음을 내고,
잠자던 산이 비명을 지르며 불을 내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불태우기라도하면
인간의 찬거리는 매우 빈약해집니다. (이런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종교의 씨앗이 되지요)
그렇다고 견과류를 주식으로 하자니 인간에게 너무 해로운 독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느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듯, 가는 곳마다 물을 거대 조류의 알에 채워넣고
입구를 풀로 막아 흙 속에 묻어두다가 물이 부족하면 찾아먹는다지만
사람이 물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
그때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벼와 보리, 밀과 같은 곡류였습니다.
농사가 최초로 시작된 터키의 들판에 자라는 원시 곡류는 그다지 맛이 없었습니다.
다만 견과류에 비해 독성이 없고 그렇게 쓴 맛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래오래 아껴서 먹을 수 있다는 건 어느 음식도 따라올 수 없는 장점이 있었죠.
영양을 생각하면 5년, 그저 배를 채운다면 10년은 간다니
일방적으로 굶을 확률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었죠.
요즘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한 줄기에 너댓 알 가량 달리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을만한 보험이 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고보니 환단고기란 책에 단군조선 시절 어느 연도에
(농사가 잘되어) 벼이삭 하나에 낱알 여덟 개가 달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그 책에서 유일하게 역사성을 가진 내용이더군요.
(물론 그 연대를 믿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농사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가함의 상실, 중노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곡식이 심어지고 나서 농부에게
‘아저씨, 저희들은 열심히 자랄 것이니 푹 쉬다 가을에 수확하러 오시어요’라고 한다면
매우 이상적이겠으나 ‘사람과 곡물의 말이 사맛디 아니하여’ 뜻이 통하지 않고
또 돌보아주지 않으면 쉬이 죽어버리는 ‘어여쁜’ 것들이기에
인간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이 땅에 얽매여 사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고민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삶을 선택할 것이냐, 고난의 길(?)을 고수할 것이냐.
자, 햄릿의 그것보다 훨씬 난감한 고민이죠?
개발과 성장의 논리와 보호와 분배의 논리의 다툼은 요즘 얘기만은 아니죠?
게다가 아버지의 벌려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는 난관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젠장! 농사를 지을 땅이 요즘과 같은 개활지가 아니라 전부 원시림이군요!
그냥 허허벌판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면 빨래, 아니 ‘파종 끝~!’하고 기지개를 펴는 수준이 아니라
빽빽하게 들어찬 나무들을 베어내고 뿌리를 걷어내고, 돌들을 걷어내야 하는군요.
(지못미 아버지!!!!!!!!!!!!!!!!!!!!!!!!!!!!!!!!!)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수렵채집과 농사를 병행합니다.
심어둔 곡식을 방치플레이 시키곤(가죽끈으로 묶어놓고 떠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여름에 잔뜩 단백질을 섭취한 후 가을 쯤 돌아와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마구마구 불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아버지는 농사꾼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사냥꾼 한 명이 뛰어다닐 땅에서 농사는 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여 살립니다.
‘나는 커서 아빠처럼 머~찐 사냥꾼이 될 꼬야’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도 사냥꾼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유와 멋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란 존재는 가족을 먹여살리는 일이라면 어떤 치사한 짓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몸에 익은 생활양식을 버리고 농경을 선택한 사건을
우리는 신석기혁명이라 부릅니다.
단순한 먹거리 수급방식의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라 아니라
인류의 생활양식을 근본적으로 뒤바꾼 것이기에 혁명이란 대단한 단어를 붙입니다.
농사란 것은 하루도 신경을 다른 곳에 둘 수가 없죠.
그러다보니 경작지를 떠나지 못하고 반영구적인 주거를 찾게 됩니다.
계절마다 따먹을 것이나 사냥할 것을 따라 다닐 때야 대충 비바람만 막으면 되었겠지만
이젠 오래오래 살 집을 구해야겠죠.
게다가 농사를 짓기 위한 사전작업, 즉 개간이나 홍수대비는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여기서 마을이 탄생하고 이 마을들이 모여 도시, 국가로 가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각자 익혀야하는 지식들이 모여 더 큰 지식이 되고 공유하게 되니
이런 마을의 탄생은 문명의 씨앗이 됩니다.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하지 않으면 무엇을 혁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다음주 화요일에는 “004. 아버지, 진흙 갖고 뭐하셔요”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라간, 이것을 키시리아님께. 그것은 좋은 것이다~~.
- 120509 수정
'역사이야기 > 세계사 뒷담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 005. 텔레토비 동산의 자유가 사라지는 날.. (8) | 2012.05.29 |
|---|---|
| 004. 아빠, 진흙갖고 뭐하셔요? (6) | 2012.05.22 |
| 세계사 뒷담화 읽기에 필요한 책들.. (0) | 2012.05.16 |
| 002. 구석기 시대의 한가한 아버지, 일상의 고투 (6) | 2012.05.08 |
| 001. 인간, 말을 하다. 잘났어 정말! (4) | 2012.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