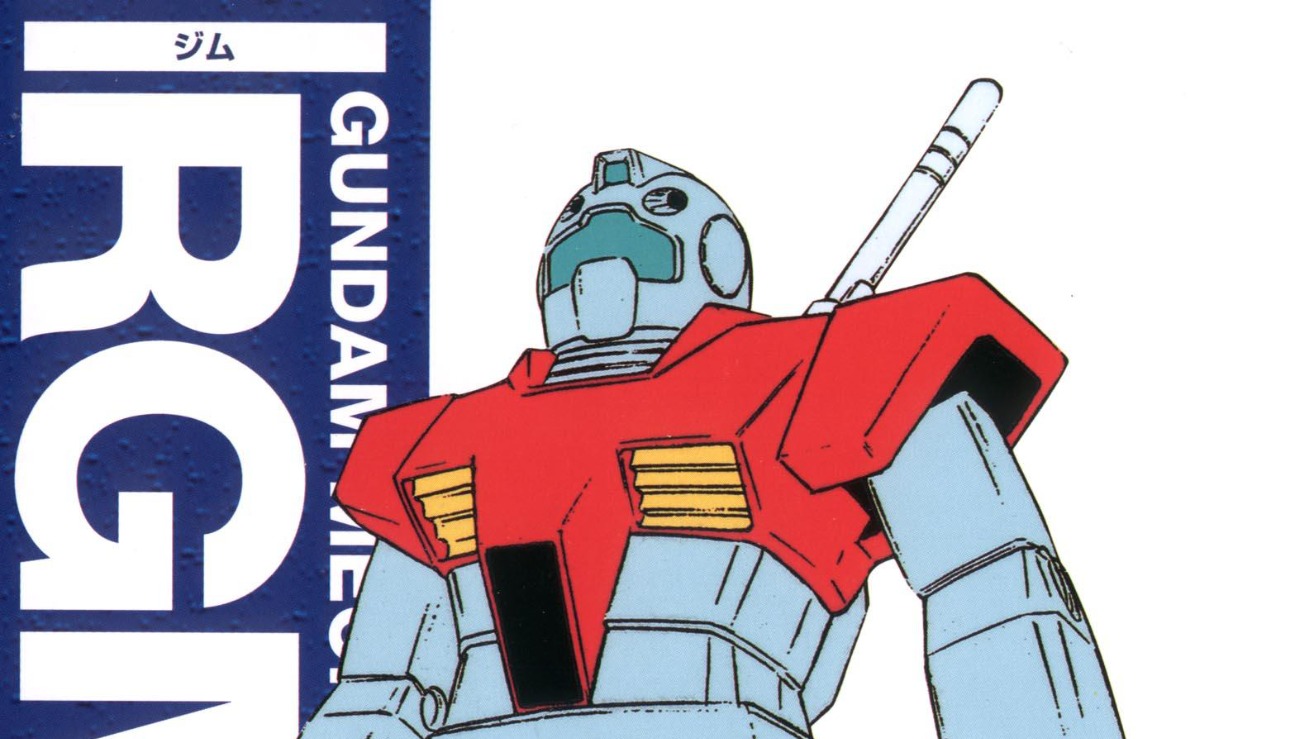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목판본과 주자본의 차이 본문
삼국사기는 완성 직후부터 여러 차례 인쇄되었습니다. 과거의 책이라는 게, 요즘처럼 한방에 수백 부, 수천 부를 찍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보관되다가 없으면 또 찍거나, 그냥 필사해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몇 번 말했지만 과거의 책은 특정 전쟁으로 불타는 것보다 일상적인 화재, 수해, 관리소홀 등으로 없어지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저 전쟁 한 번에 타오르는 장면이 워낙 압도적이라 그렇게 뇌리에 남을 뿐이죠.
삼국사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이 네 번 목판본으로 찍고, 한 번 금속활자본으로 찍었습니다. 딱 이렇게만 찍었다가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삼국사기 판본을 검토해 보니 이렇습니다. 현재 통용되는 각 판본의 연대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판본 | 연대 |
| 목판 | 1차 | 1146(인종 사후)~1174(명종 4년) 사이 |
| 2차(성암거서박물관 소장본) | 13세기 중엽? | |
| 3차 | 1394(태조 4년) | |
| 4차(임신본, 정덕본) | 1512(중종 7년) | |
| 금속활자 | 현종실록 주자본 | 1711(숙종 37년) |
1차 연대는 아직 모릅니다. 일단 이게 완성되었을 때는 인종이 죽느냐 마느냐 할 때라 일단 필사본으로 제출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인쇄에 들어갔겠지요. 1174년 듕궉에서 이걸 입수했다는 기록이 나오니 아마 인종 다음 왕인 의종 즉위 초반에 찍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식이 1151년(의종 5)에 죽으니 그전에 찍었을 것입니다.
이후 여러차례 재판 인쇄가 이루어지는데 마지막 인쇄는 중종 때 이루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정덕본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는 판본입니다. 재미있는 건, 전면 재작업이 아니라 이전 판본에서 파손된 부분, 그러니까 목판이라 쓰면 쓸수록 자꾸 부서지고 깨지는 글자가 나오지요. 일반적으로 다시 찍기보다 작은 토막에 새 글자를 새겨, 깨진 것을 긁어내고 새 글자를 박아 넣습니다. 최소 3차부터의 작업은 기존 목판에서 쓸만한 부분은 다시 쓰고, 사용불가능한 판은 새로 새겨 작업 속도를 줄였습니다. 목판 인쇄는 정말 돈을 잡아먹는 사업이라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 찍는 건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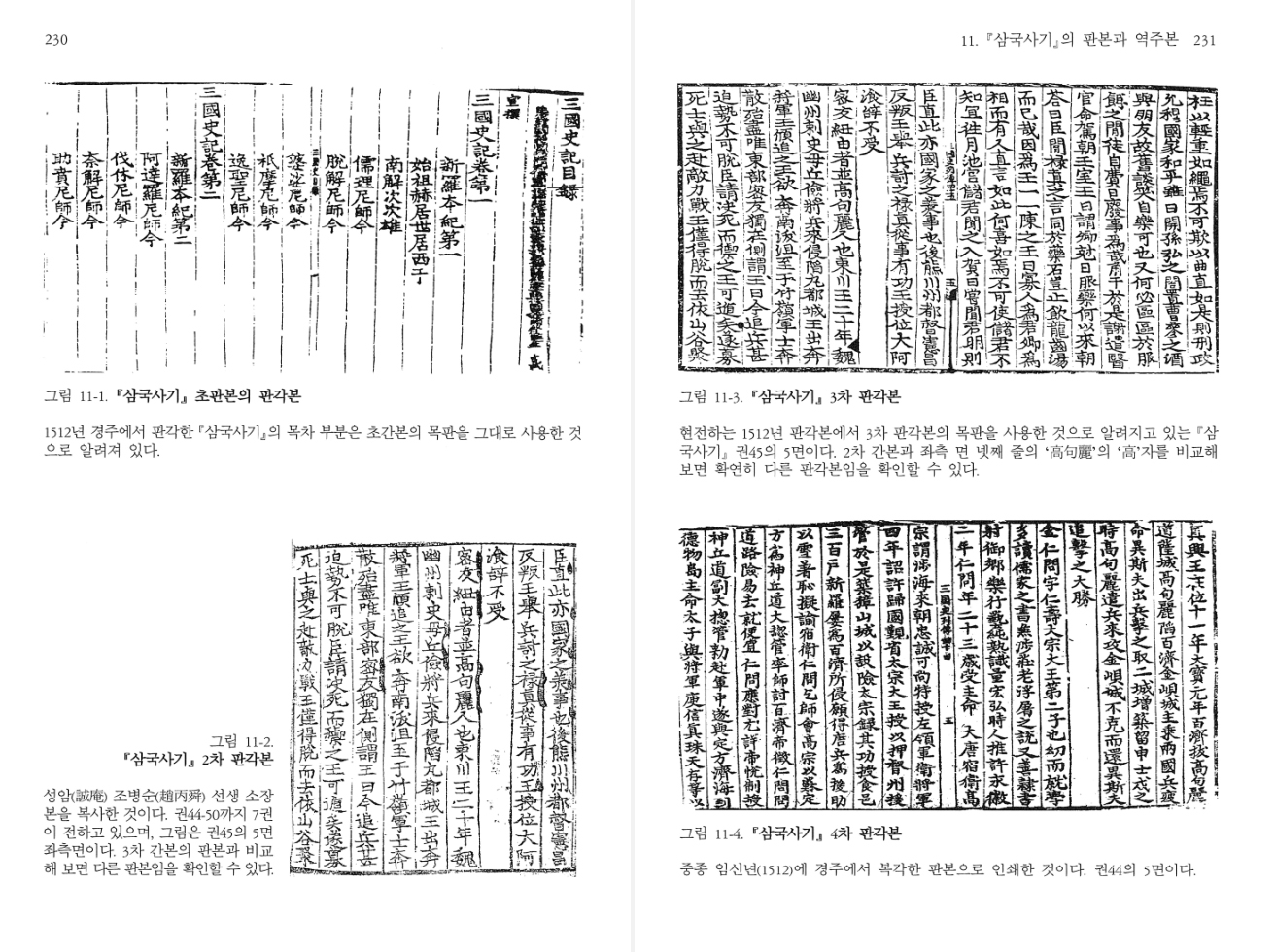
현재 남아있는 4차 판본에는 지난 판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주자본으로 원사료를 보기 시작한 입장에서는 잘 알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요즘에야 목판본을 펼쳐들게 되어 실제 차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주자본은 현종실록을 찍을 때 만든 금속활자로 찍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조 때 찍은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일본으로 건너간 판본에 권상하라는 문신이 숙종에게 하사받았다는 글귀가 적혀있어 정확한 간행연대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원래 각 판본별 연대에 관해 글을 쓰려고 자료를 뒤지던 중에 만든 것입니다. 권17, 고구려본기5에 실린 중천왕 12년조의 기사인데 이것으로 초간연대를 파악하는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후일로 잠시 미루고 일단 목판본과 주자본의 인쇄의 느낌만 보시기 바랍니다.

목판본은 원고를 붓으로 정서하면 그것을 보고, 또는 뒤집어 목판에 붙인 다음 목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글자크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필사본처럼, 처음에는 글씨를 크게, 또는 획수가 많은 글자를 연달아 쓰다가 공간을 너무 많이 소모하여 아래쪽에는 글자가 촘촘해지는 경우도 가끔 보입니다. 그러나 주자본은 다릅니다. 텅 빈 판에 금속 활자를 조합해 넣는 것이므로 글자 크기는 일정하고 소위 자간, 장평이 고릅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보기엔 주자본이 더 접근하기 둏아 보입니다. 물론 글자의 교감 문제로 들어가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가운데 줄 상단의 작은 글씨는 일종의 각주입이다. 위나라 장수 위지해가 쳐들어왔다는 기사인데, 하필 인종의 이름이 해楷라서 그 글자를 뺀 것입니다. 이를 피휘라 하는데 무턱대고 안 쓰면 후일 독자가 위나라 장수는 위지란 놈이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장릉(인종의 묘호)의 이름과 같으므로 뺐다는 주를 단 것입니다.
일단 오늘의 글은 여기까지. 지지난달엔 사고를 당하고, 또 여기저기 아픈 통에 간단한 수술을 받아서 온 몸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니 전뇌의 장비가 정지했다 말았다를 반복하는군요.
'삼국사기학 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연의 오독, 그러나 고의는 아님 (2) | 2025.02.25 |
|---|---|
| 살아남은 삼국사기 (2) | 2025.02.19 |
| 고려시대 사학사를 다시 써야하나.. (0) | 2024.04.23 |
| 구삼국사를 비롯한 고대~고려 전기 사관제도에 대한 잡상 (0) | 2022.03.09 |
| 고려도경에 실린 김부식 소개 (2) | 2019.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