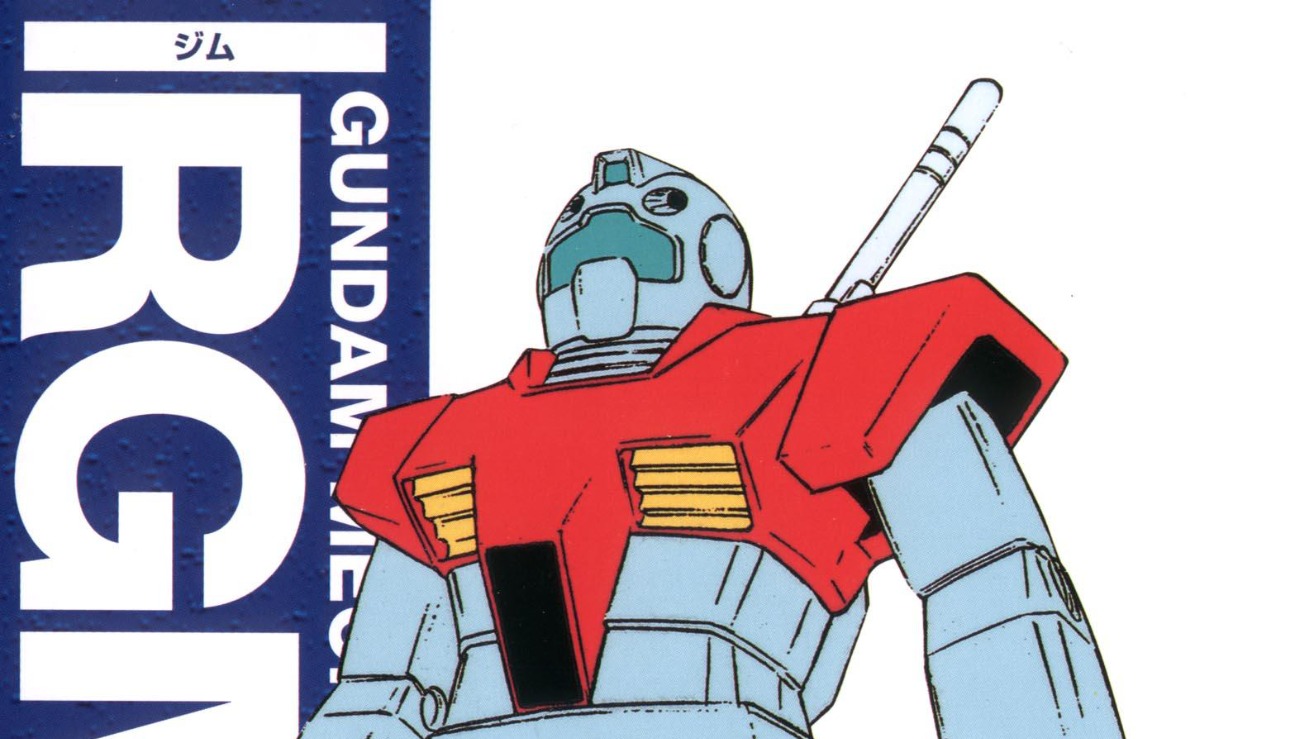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첨성대는 과연 천문관측을 하였을까? 본문

선덕왕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 첨성대는 현존하는 세계최초의 천문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천문대였느냐와 첨성대 건축의 과학적 비밀을 찾는 것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과연 그 시대의 천문관측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한마디로 'ㄱ'과 'ㄴ'을 모르는 상태에서 국어문법이나 문학비평이 이루어진달까.
왜 천문대를 짓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천문대 논쟁과 건축의 의미는 풀 수가 없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천문학의 이야기다.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기본 전제로 이야기할 것은
과거의 천문학은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주와 지구 탄생의 원리나
우주의 다른 환경을 연구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척어도 천체에 대한 과학적 접근 이전의 천문학을 과거의 천문학이라고 편의상 부르겠다)
물론 인간이 별을 바라본 역사는 길다.
메소포타미아의 어는 나라에서는 군인 신체검사 중에
시리우스를 볼 수 있는가를 보는 항목이 있었다.
이집트에선 별의 움직임을 살펴 나일강의 범람을 예견했다.
더 멀리 가자면 우리나라의 고인돌이나 고령의 암각화에는 별을 본 관찰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현대의 천문학과 달리 그 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실제 어떤 형태인지,
어떤 움직임을 가지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었다.
아니 지구만이 유일한 생명의 터전이란 생각에
하늘의 별은 방 천장에 붙여둔 야광스티커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늘과 지상을 연결해주는 안내자로 밖에 보질 않았다.
그래서 과거의 천문학은 하늘의 신호를 해석해
인간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해설하는 일을 수행한 것이다..
만약 이런 과거 천문학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현대적 천문대를 떠올리며
첨성대가 천문대였네 아니였네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과거 천문학의 특성상 국가권력에 많은 부분을 기댈 수 밖에 없었다.
하늘의 뜻을 국가 통치의 정당성과 연결시킨 동북아의 국가들은 특히 그런 성향이 강했다.
그 날의 하늘의 기운을 살피고 별의 운동에 따라 그 해의 달력을 만드는 것은
통치자의 중요한 업무이자 권리이기도 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사로이 별의 기운을 해석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옛 천문대는 그 자체가 국가기관이었다.

현대의 천문대는 왜 산 위에 있을까?
유럽연합의 공동천문대는 남미 안데스 산맥 5천미터 높이에 지어졌다.
이런 질문을 하면 가장 흔히 듣는 답이 공기오염이란 말을 듣는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도시의 불 빛이다.
인공위성 궤도에서 밤의 지구는 온통 검어야 하는데 도시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다.
그 빛이 우주로부터 오는 불 빛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소백산 같은 곳에 천문대가 지어지고
대구경의 망원경으로 우주의 심연까지 보는 것이 가능해지자
이젠 교란요소를 피하기 위해 그렇게 추운 산 위로 천문학자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 놈의 매연은 조금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보자.
밤에 불빛은 없고, 그저 오로지 눈으로만 별을 볼 수 있던 시절에 산 속의 천문대가 필요할까?
지상에서나 2천미터 산이나 별 차이가 있었을까?
고작 10미터 단을 쌓고 올라가 본다고 130억광년에 위치한 별이 보이는가?
어차피 지구 상에서 맨 눈으로 보일 별이라면 어느 높이에서나 다를 바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보는 사람의 시력의 차이밖에 없다.
게다가 종로에서 청량리 쯤 떨어진 촛불도 보았을 거라는(그의 시력을 비유하면 말이다)
유럽의 마지막 맨눈 관측자인 체코의 티코 브라헤가 아닌 담에야 차이가 없다.
그리고 365개의 돌을 28단으로 정교하게 쌓으면 심청이 아버지도 별을 볼 수 있다던가.
이것은 건축의 미학에서 논할 문제지 천문학 관측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다.
게다가 별을 보는 사람은 요즘말로 공무원이다.
언제 소백산에서 내려와 경주로, 개성으로, 한양으로 달려가 보고를 하랴.
그렇다면 우리는 첨성대에 대해 지나치게 실용적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누가 저 앞에서 꽃을 들고 오는데 자기 혼자서 저 사람은 10년 전부터 나를 사랑했어라고
혼자 해석하고 얼굴 붉어지고 심장 콩닥콩닥하는 꼴이다.
사실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하다.
그 시대의 별을 보는 것은 하나의 의례를 치루듯 경건한 것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토록 입에 담는 첨성대 건축의 과학적 원리도
별을 잘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별을 보는 행위의 의식성이 담긴 것이다.
미안하다 서문이 90% 넘었다.
그냥 이 인간은 미괄식 엄청 좋아해라고 생각해라. 그게 편하다.
화이트베이스의 어느 용사 말마따나 맞/는/다/고 고/쳐/지/냐.
'역사이야기 > 역사와 과학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석기는 그냥 돌과 무엇이 다른가? (6) | 2012.08.06 |
|---|---|
| 따비와 가래, 그리고 쟁기.. (4) | 2012.07.28 |
| IT나 역사 얘기는 먼 것이 아니다. (20) | 2012.06.28 |
| 신병기의 채용이 바로 전술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이유..(1) (2) | 2012.05.19 |
| 멜빈 크란츠버그의 기술사의 6원칙 (2) | 201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