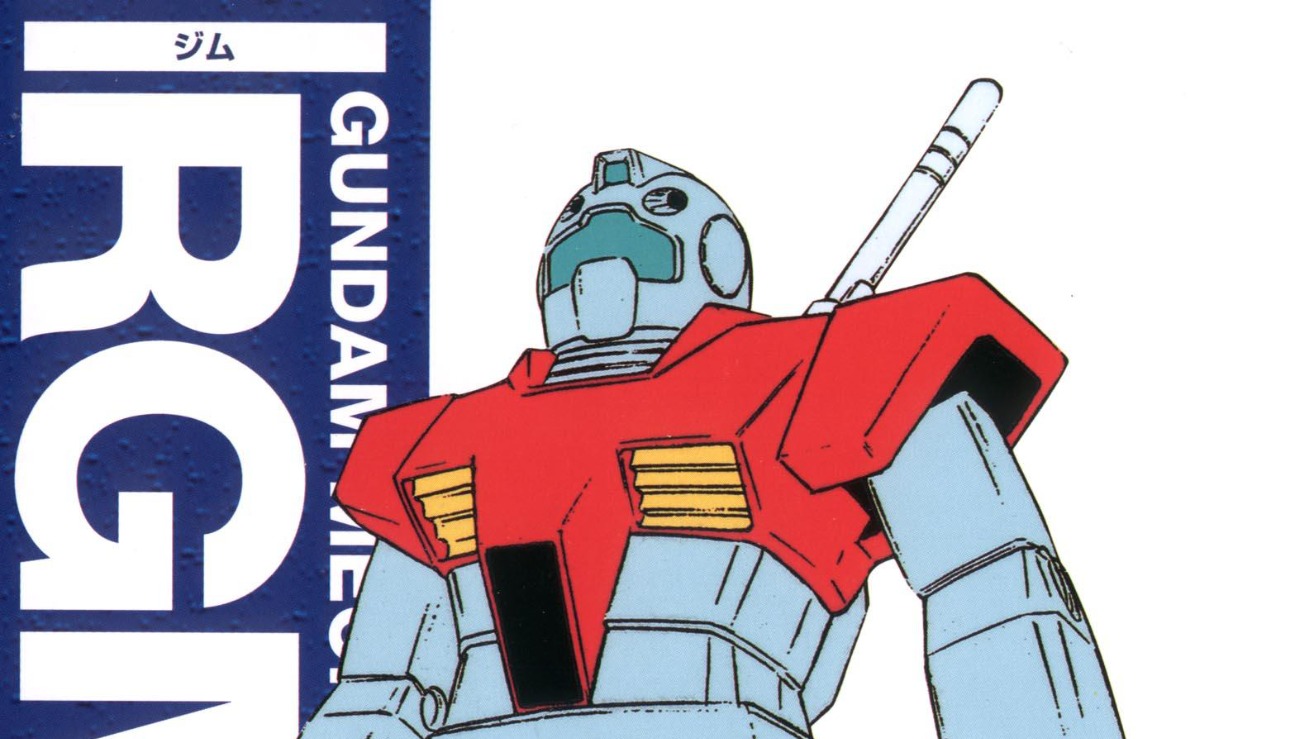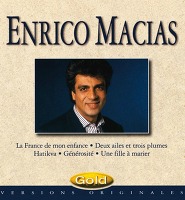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치욕을 긍정하자. 그것도 역사다.. 본문

어제와 그제는 여기에 그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특히 어제는 여기저기를 다녀야 했고 수도 없이 흘린 땀에 기력은 쇠했다.
저녁을 먹기 전 둘러보는데 읽는 것 조차 힘들었다.
밥을 먹고 나서는 그동안 정리하던 삼국사기 직관지의 자료작업을 끝내야 했다.
쓸 거는 무척 밀렸는데 이 정도면 쉬어야 하는 건 출근만이 아닌 듯하다.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가며 지갑도 떨어뜨리고 갈뻔했다.
역시 여름은 지옥의 계절이다.
지증왕 얘기가 조금 늦어지고 금새 잇는다던 세계사 글이 안올라와도 그러려니 하시라.
한때는 한 겨울에 창문도 열고 자고, 12월의 정선의 찬물로 목욕도 하고,
아프기 전까진 방안 보일러 온도를 10도로 맞추고 살던 한랭지특화형 연방의 폭죽이다.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여름.
지금 뇌도 녹고 있다.
오늘 읽은 글 중에서 전공과 가장 가까웠던 글은 무터킨더님의
독일학생의 국가의식은 반독일 정서에서 출발이란 글이었다.
뭐랄까 독일인들의 생각과 출발동기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역사로 마스터베이션 하지 말자, 부끄러운 역사도 끌어안자는 생각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연구의 대상이던, 유희의 대상이던 뭘로 봐도 좋은데
최소한의 지켜주어야할 불문율은 있다.
그 중 하나가 아프고, 부끄럽고, 잘못한 것도 역사로 끌어안는 마음이다.
실제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들이나, 두어달 이상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역사로 거짓말하고 자기 위안 삼으려는 거 무척 싫어한다.
하도 그런 사람들에 지친 나머지 차라리 역사에 관심들 끊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도 한다.
사실 역사란 것이 IT나 스포츠에 비해 진입장벽이 참으로 낮아보인다는 착각을 던져주기도 하기에
다른 종목보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사실 위안을 얻고 싶으면 종교를 갖던가, 카운셀러를 만나던가,
아니면 사랑이라도 찾아야 하는 게 정상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역사에서 위안을 받으려는 것이다.
다들 환빠들에 진절머리를 내는데 솔직히 이런 사람들보다 환빠가 더 나아보일 때가 많다.
차라리 그들은 사료(?)에 의존하기라도 하잖아.
사실 60년대부터 비롯된 재야사학과의 국사교과서 논쟁에서
나중에 국회가서 단군이 곰에게서 태어난 거 맞냐고 질문받는 청문회도 있었고,
80년대 중반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 어느 세미나 속기록엔
환빠들에 의한 난동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 걸 겪고나서 이바닥 어르신들 머리 속에 대중과의 연결에 대한 공포감이 커진 건 사실이다.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선배들 중 상당수가 또 그런 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사실 석사 때 싸우기도 많이했는데 결국 그때부터 야금야금 활동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때도 ㅂㅅ, 지금은 숨어서 ㅂㅅ짓하는 거지. 쓰라는 논문은 안쓰고..)
그래선지 이런 말도 안되는 자기위안적 역사관이 퍼져가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다행인 건 내 바로 약간 위 연배들부터 대중적인 책을 쓰기 시작한 건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차라리 환빠들은 패턴이라도 읽을 수 있었고, 서로 평행선을 달려도 대화는 존재했는데
그때가 정규전이라면 지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다.
이걸 가지고 한국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한 왜곡으로 치부하기엔 우스운 것이
대체 20세기에 마냥 행복할 수 있었던 민족이나 국가가 어디 있었는가.
하다못해 남태평양의 사람들까지 외롭고 슬프고 아프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냐는 것이다.
마치 운동경기에서 상대편은 정신력 하나 없고, 우리만 한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잡다하게 암기의 대상이 된 우리 역사교육에 철학이 없었던 것이지.
우리 현대사 운운 역시 역새 왜곡이라면 왜곡이다.
잘한 것은 잘한 것 그대로, 못한 것은 못한대로 끌어안는 것도 역사를 읽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사람들, 어이 없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둥, 김부식은 사대주의자라는 둥 욕은 쉽게 하는데
적어도 사실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한 이들을 욕할 자격이 없다.
述而不作, 적되 지어내지 않는다.
그 유교적 역사학이 낡았다고 손가락질 하면서
읽는 것과 말하는 것과 키보드로 써갈기는 건 무슨 역사적 퇴보행위인가?
자기의 업적도 다 조상에게 몰아놓고는 우리 조상은 정말 위대하였다.
그 피를 이어받은 나는 역시 대단하다고 주장하는 삼국시대 초기 왕들의 인식과 다를바가 없다.
그래놓고는 자기는 현대인이라고 잘난척 하는 것 보소.
참말로 폭군 걸왕의 개가 웃다 숨넘어가네.
소설가 김훈씨가 쓴 글 중에 갠적으로 좋아하는 글인데 아직 링크가 살아있어 여기에 올려본다.
(그냥 옮기고 싶은데 요즘은 그러면 안되니까.. 그냥 링크 따라 가보시라)
치욕을 긍정하기 위하여서는, 교과서에 그 고통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가장 온당한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아이들이 자라나서 스스로 그 치욕의 역사를 알게 될 때의 혼란과, 제도에 대한 불신과 역사에 대한 환멸이 이 고통스런 논쟁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미 어른이 되어서 늙어가고 있다. 우리는 사실의 바탕 위에서만 화해하거나 청산할 수 있다. 화해할 수 없는 대목이 있을 것이다.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불화와 단죄조차도 사실의 바탕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 마침내 화해할 수 없는 것들과의 불화는 역사를 도덕적으로 긴장시켜줄 수 있다. 그리고 치욕의 역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불화는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 김훈, 치욕, 씨네 21 353호 (2002.05.22) 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역사는 자위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못된다.
인터넷만 조금 뒤지면 얻어걸리는 야동이라도 다운받아 보시던가,
아니면 서점이나 편의점 가판대에서 맥심이나 사서 보던가 했으면 좋겠다.
역사가 찐득찐득한 뭔가 이상한 걸로 덮혀지는 거 질색이다.
'역사이야기 > 역사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학원생 덤핑시대를 맞이하여.. (8) | 2012.08.02 |
|---|---|
| 녹슨 총보다 멋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18) | 2012.07.29 |
| 눈물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8) | 2012.07.13 |
| 전자책으로 사료를 볼 수 있는 세상.. (18) | 2012.07.12 |
| 두개의 문을 보다.. (18) | 201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