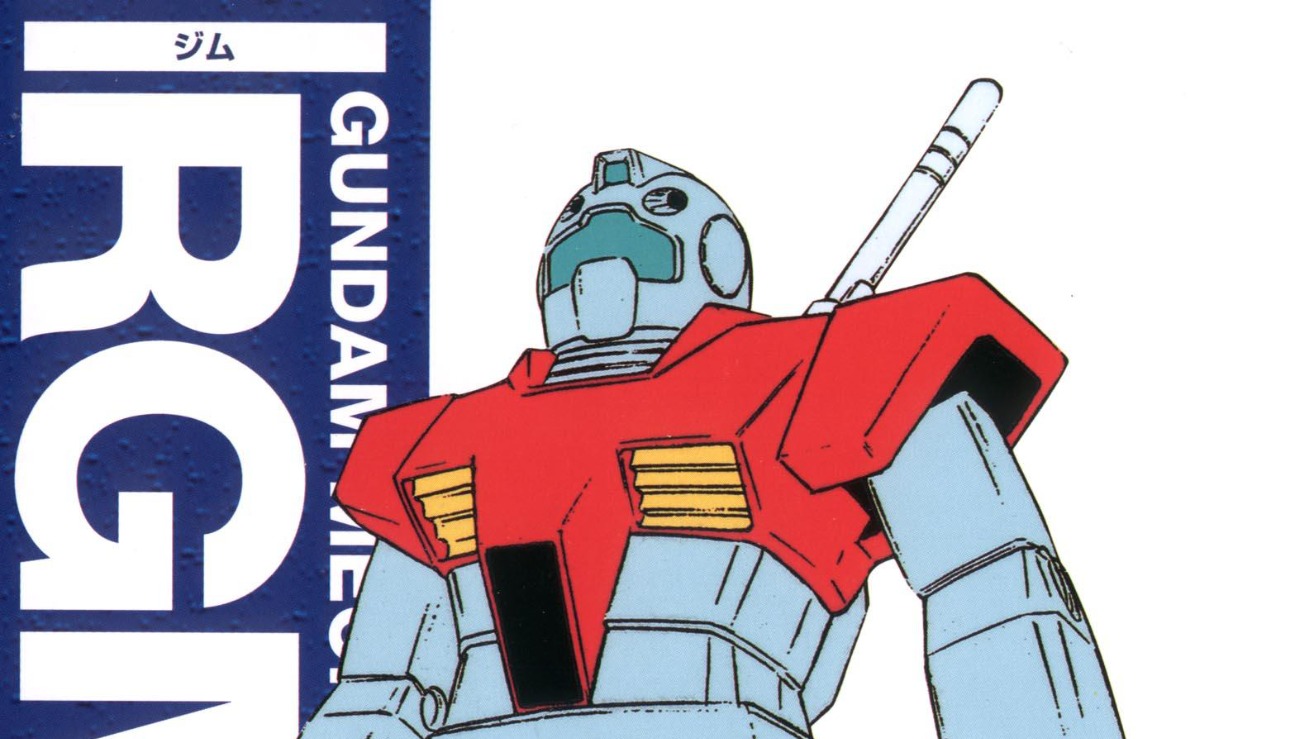목록사학사 (2)
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고려시대 사학사를 다시 써야하나..
고려시대 사학사를 다시 써야하나..
아까 정구복 으르신 책을 읽다가 뭔가 찾아봐야해서 "시민의 한국사"를 폈다. 그런데 후고려(이 왕조의 패악질은 4~5세기 이후 고구마가 국호를 고려로 글자를 줄였음을 감추고, 그 이름을 오롯이 자기 이름으로 한 것에 있다. 그래서 돌라 안둏아해)의 문화 부분에서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부식옵하도 아직 먹도 안마른 따끈따근한 "자치통감"을 구해다 썼고, 일본 궁내성 도서관에 숙종(그래도 후대 왕조의 세조와 달리 조카를 담그진 않았다!)의 장서인이 찍힌 "통전"이 있긴하다. 소동파가 책수출금지같은 소릴 지끼긴 했는데 실제론 고려에서 사라진 책을 구하는 중이었다.(사실 소동파가 혐한한 건 "글안"을 물리치고 이 후고려 사신놈들이 대패한 송나라 놈들 약올려서란 얘기도 있다) 한서, 진서, 당서(아마 구..
글쎄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대사학이라면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른바 실증사학이라는 학풍이 사학연구의 기조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사학의 성립이랄가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과정이고 필연의 추세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엄밀한 사료의 비판을 통해서 정확한 고증을 거쳐 ‘과거의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는 그러한 견지에 서는 것이 역사학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역사해석이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권선징악적인 견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크로체’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