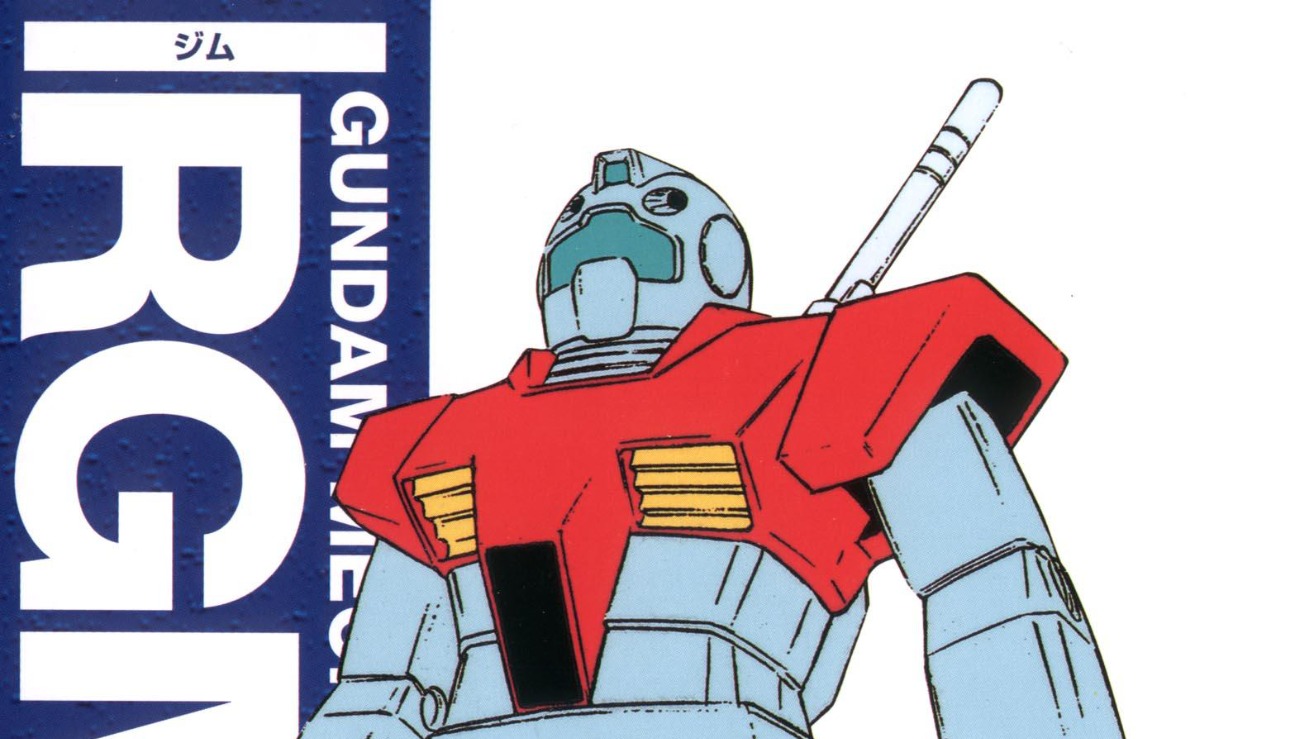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실증사학 본문
글쎄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근대사학이라면 일제시대에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여져서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이른바 실증사학이라는 학풍이 사학연구의 기조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근대사학의 성립이랄가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과정이고 필연의 추세였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엄밀한 사료의 비판을 통해서 정확한 고증을 거쳐 ‘과거의 사실을 사실대로 밝힌다’는 그러한 견지에 서는 것이 역사학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은 역사해석이 신화적이거나 종교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권선징악적인 견지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의미가 있었던 것입 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크로체’이후로 ‘EH.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른바 실증사학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구명이라는 것보다도 역사가의 주관을 내세우는 경향으로, 이를테면 역사의식의 문제가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서술은 단순한 과거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역사가의 역사의식 내지는 사관에 의해서 체계화된 것이어야 한다는 요구가 앞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방 이후의 한국사학이 현재 어떠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즈음 흔히 민족사학이니 민족사관이니 하는 것이 거론되는 소이도 그러한 반성 내지 검토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종래의 문학적인 연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이 정확한 사실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으며, 또 실증사학의 극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실증정신을 몰각하는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되겠읍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역사학자가 언제까지 문헌의 ‘정글’ 속에서 헤매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역사학이 문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해서 사학자가 주제의 선택에서부터 연구에 틀을 마련하는데 이르기까지 문헌 속에 빠져있어서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올바른 문제의식을 드러낼 수도 없으며 제대로의 해석이 얻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종래의 이른바 문헌학적 연구태도를 지양해야겠다는 요망 속에서 오늘날 아직도 미개척 분야가 많이 남겨져있는 한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고 전 을 보여왔는가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많은 정확한 지식이, 그리고 조속한 한국사의 체계화가 요망되는, 이를테면 이중적인 직무를 감당해내야할 위치에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역사연구의 기초적인 훈련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반면에 또 무슨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지 않나 싶은 느낌도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문제의식과도 관련되겠지만 사학도들이 너무 빨리 전문화되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애초부터 특수한 문제를 단편적, 개별적으로 유리시켜서 연구하여 그러한 연구의 성과로서는 서로 관련되는 문제에 관해서조차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해・인식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한국 근대사학의 연조가 얕고 학문이 분화발전의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점과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적으로 말한다면 역사가의 사관, 역사의식・인식태도 등의 문제라고도 생각됩니다.
- "우리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150~152쪽 한우근의 발언
한국사학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꼭 빼놓지 말아야할 책인 "우리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4장 초반부에 나오는 한우근의 발언이다. 실증사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에 대한 한우근의 의견.
사학사의 연구에서 현대적 관점에서 과거의 저작을 비판(고인디스)하는 거야 당연한 것이다만, 8090연간 이래 많은 이들이 취하는 태도에 온당치 않은 부분도 있다. 바로 실증사학에 대한 부분이다. 실증사학의 단점이야 다 옳은 말인데, 연구사적으로 보면 그 지적 중 합당한 것은 과연 몇이나 될까 싶다. 실증사학의 한계라는 것은 역사연구가 체계적으로 뿌리내리며 한 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이 비판의 근거로 삼는 타국가, 타대륙의 연구에서도 다들 겪은 것이다. 이를테면 아날학파의 거두였던 마르크 블로크의 아버지도 계량사학자였다. 그 시대 서구권 연구자들 상당수가 실증적 방법론에 입각해 연구를 하고 있었다. 사관에 의한 역사인식 조차도 실증의 실증을 거듭하고서 나온 것이지 갑자기 책상 위에 앉아있다가 새로운 역사학의 조류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애초의 블로크의 연구도 또 무수한 머니먹은 서류들과의 싸움 후에 나온 것이고.
한국에서 역사학연구가 현대적인 학문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주 길게 잡아야 애국계몽시기, 보통은 진단학회 설립이 될 것이고 매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역사학회의 설립시점이다. 출발이 한참 늦었는데, 게다가 식민사학의 청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자리잡고 있는데 그 때 실증적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비판은 논리적으론 맞는 얘긴데 현실적으로라면 옆집 고등학생이 미적분 문제를 푸는 것을 보고 초등학생인 자식 멱살잡는 형국이 아니었을까?
학자 개개인에 따라 자기 학설, 연구방법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존재하였지만, 그 비판점을 놓고 보면 마치 주자학자가 양명학 비판하듯하였거나, 실증사학의 궤를 따르지 않는다고 광산에 가두고 총질한 것처럼 접하고 있다는 게 과연 제대로 역사인식을 갖추고 하는 것일까란 의문도 나온다.
실증, 문헌 등 자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은 미술에서의 데셍과 같다. 한 번은 다 해보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지. 다들 파블로 피카소를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이라고, 그의 기묘한 그림들을 칭찬하지만 그가 거기까지 이르는 동안 엄청난 양의 데셍을 거쳤다는 것은 간과한다. 그냥 붓을 들고 휘두른다고 그와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 가는 잘 모르겠다.(뭐 현대미술은 무식한 자-짐순이가 그렇다-가 보기엔 그냥 같다붙이기같이 보이기도 한다만, 보이는 사람에겐 또 잘보이는 것이겠지)
'역사이야기 > 역사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이소에서 산 모나미 붓펜. (2) | 2024.03.22 |
|---|---|
| 말의 차이, 과거와 지금의 간극 (0) | 2023.04.07 |
| 역사에 공소시효가 있을까? (0) | 2022.01.22 |
| 전태일을 생각한다.. (0) | 2021.06.02 |
| 일본이 G7의 확대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 역사적 맥락 (0) | 2020.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