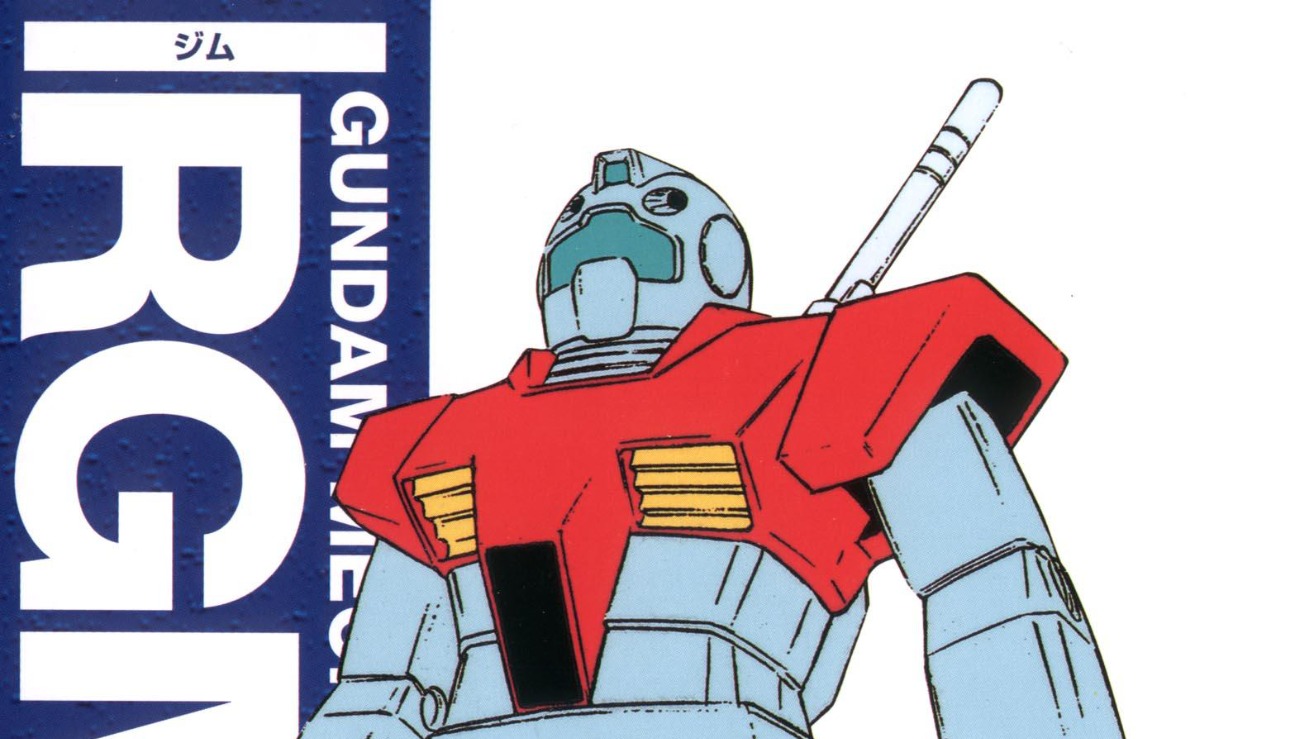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시대구분론은 역사연구의 시작이자 끝이다.. 본문
몇 년전이었던가 어느 선생님이 내년 2월에 하는 고대사학회 합동토론회의 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리의 모든 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때 짐순이는 시대구분론을 들이밀었다. 분위기가 숙연해져 과학기술은 어떻냐고 했지만 그 합동토론회 주제가 뭐였던가.. 뭐 뒤져보면 나오겠지만 귀찮다! 고대사학회의 출범 초기인 93년 합동토론회에서 이미 고대사의 시대구분론을 다루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고대사연구 8집에 실렸다. 그래서 학계의 초관심사가 아닌 이상 지금 또 다룰 리는 없다는 걸 알면서 한 말이긴 했지만.(맘속 2번은 삼국사기였습니다! 이건 금세기 초에 했는데!!!)

90년대 후반의 학계는 1970년대 후반에 했던 경제사학회의 "한국사시대구분론" 세미나 이후 간만에 시대구분론을 다루었다. 고대사학회 말고도 국편이나 정문연(현 한중연)에서도 한국사 전반의 시대구분론을 다루었고, 또 국민대였던가 대학연구소 차원에서도 시대구분론을 다루고 있었다.
특히 고대사에 한정해서 말하자면 나말여초를 고대와 중세의 분기로 보던 기존 학통설 당시엔 소장이었던 분들이 7세기 전쟁까지 경계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새로운 시각을 들고 일어났다. 한국사학계 전반이야 어떻든 고대사학계는 시대구분을 해야했던 거다.
개인적으로 짐순이는 통일신라의 중세스런 분위기는 표피의 화장술에 불과하고 내면 깊숙한 흐름은 여전히 삼국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중세론자(?)들이 끊임 없이 추구하던 변화상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관료제 부분만 아니라면 충분히 고대의 완성/숙성이라는 시각에서 볼 수 있기도 하다.(발해는? 물론 발해도 한국사의 일부라고 보지만 발해의 시스템을 놓고 보기엔 특수한 환경에 기인한 것이 너무 많다)
중게 기점을 이야기하자면 책 한권을 써도 모자라니 다시 시대구분 자체로 넘어가자면 그동안의 시대구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너무 미시적인 것을 거시적 흐름일 착각하거나 시대적 변화를 마치 군대 제식훈련처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또 왕조적 구분을 봉건적 사유의 잔재라고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사대부의 문학이라는 시조는 이조년(그 이인임의 조부다!!)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문학사의 흐름에서는 고려 후기를 조선시문학의 연대에 넣을 수 있다. 또 제도사의 면에서 보자면 1392년의 조선개국 후에도 당장은 고려의 제도가 유지되고 있었다. 복식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세종조 언저리까지 고려의 복식은 남았다. 아무도 이조년을 조선시대의 첫 타자라 보지 않고 조선경국전부터 경국대전 완성에 이르는 기간을 고려 후기로 보지 않는다.
중국처럼 짧게는 수십년 길어야 백년 내외로 유지되는 왕조들이 버글버글한 것도 아니고(후삼국을 빼면 그나마 짧은 게 발해의 2백년이다. 신라는 4년 빠진 천년) 한국처럼 수백년을 넘어가는 왕조는 그것이 하나의 우주적 질서로 받아들여짐으로써 왕조의 멸망과 개창이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떤 것은 좀 빨리 구령을 알아듣고 우향우하고, 어떤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회전 중심에서 먼 것들은 한참 움직여 우향우를 하는 것이다. 하나의 변화가 '표피의 변화'인지 '골수의 전환'인지 이해해야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사실 시대의 회전은 마치 목성의 대기흐름처럼 속도가 제각각이고, 멀리서 보면 한 명의 사람이 빨리 방향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만톤의 유조선이 키를 돌리는 것과 같이 크게 선화하며 움직인다. 우리 시대만해도 왕조질서에서 벗어난지 1백년이 되지만(대일본제국 황실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36년을 어떻게 볼거냐는 차치하더라도) 정치체의 선호에서는 빨리 왕당파에서 벗어난 측면이 강했던 반면(임시정부 구성원의 정체 선택이나 해방공간에서 선호하는 정치체나) 아직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면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서구문명을 받아들인지 1세기가 지났지만 가장 심층부에 위치했던 장례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여년 전의 일이다. 그렇다면 10년 전까지 붕세봉건사회인가?(어느 서구 인류학자는 호주의 원주민이 문명화의 길을 밟은 1975년에야 인류의 선사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를 한다. 멩? 이게 호스야? 카우야?)
역사를 공부할 때 어떤 곳은 개설서를 보기도 하고 어떤 곳은 역사학의 이해를 먼저 가르치기도 한다. 어느 길을 가더라도 방향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엇비슷하게 나아간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시대구분론을 가르치는 곳은 많지 않다. 시대구분론은 어찌보면 21세기의 기피하는 지난 시대의 거대 담론과 같다. 그러나 먼저 내가 연구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적 흐름 속에 있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사료와 각론으로 다이빙하면 가야할 좌표가 보이지 않게 된다. 각론으로는 충분히 논리적이나(상당수 책상 위에서만 완벽한 논리이다) 전체 흐름에 가져다 놓았을 때 차라리 시대의 흐름과 삐걱대는 일군의 흐름도 아닌(매 시대마다 꼭 그런 인간들이 있지 않은가) 존재하지 않는 흐름을 이야기 하게 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카세트와 시디플레이어의 시대에 mp3 추출의 적정 비트레이트를 가정하는 논문을 쓰는 식이다.
꼭 시대구분이란 전제에 얽매이며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때때로 좌표점 정도는 확인해가며 항해하란 거다. 물론 그 새로운 인식이 정말 파묻혀있었던 중요점을 찾아내 새로운 항로를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또 시대구분이라는 것이 항상 하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강진철처럼 무인정권까지 고대적 질서의 흐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많이 잊혀졌지만 재검토해볼만한 설이다) 7세기 이후를 중세1, 고려 건국 이후를 중세2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개설서에 한 줄만 인용되어도 연구자로 성공한 거라는 말이 있었지만 한 시대를 인식하고 정의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빛나는 일이 아닐까?
말꼬리 ---------------
1
카세트와 시디플에이어의 시대에 비트레이트..는 황당하게 들릴 지는 모르겠으나 진짜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을 세는 게 너무 귀찮을 정도다. 특히나 5공과 6공 초반의 시대엔.. . 심지어는 역사학 뿐만 아니라 국문학에서도,
2
7세기 이후를 중세로 보는 분들의 연구도 매우 소중하다. 적어도 그 연구성과들은 그 시대구분의 인식 속에 충실하게 작성된 결과물이니까.
3
다시 한 번 고대와 중세의 분기점에 대해 이야기해볼만큼 연구의 폭이 넓어지고 충실해졌다고 본다.
4
짐순이요? 19살 어린 것은 멀리서 관전하며 팝콘이나 먹으면 됩니다. 캬캬캬..
'한국고대사이야기 > 고대사 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통일신라 운영시스템에 대한 생각 (0) | 2017.02.22 |
|---|---|
| 7세기의 전쟁은 국제전인가 내전인가? (0) | 2017.01.02 |
| 다시 만들어 배포하는 동북아 지도 (40) | 2016.10.17 |
| Re: 제로에서 시작하는 7세기 후반 국제전 공부 (0) | 2016.09.02 |
| 역사유적 복원에 대한 한국과 일본, 중국의 풍경.. (0) | 2016.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