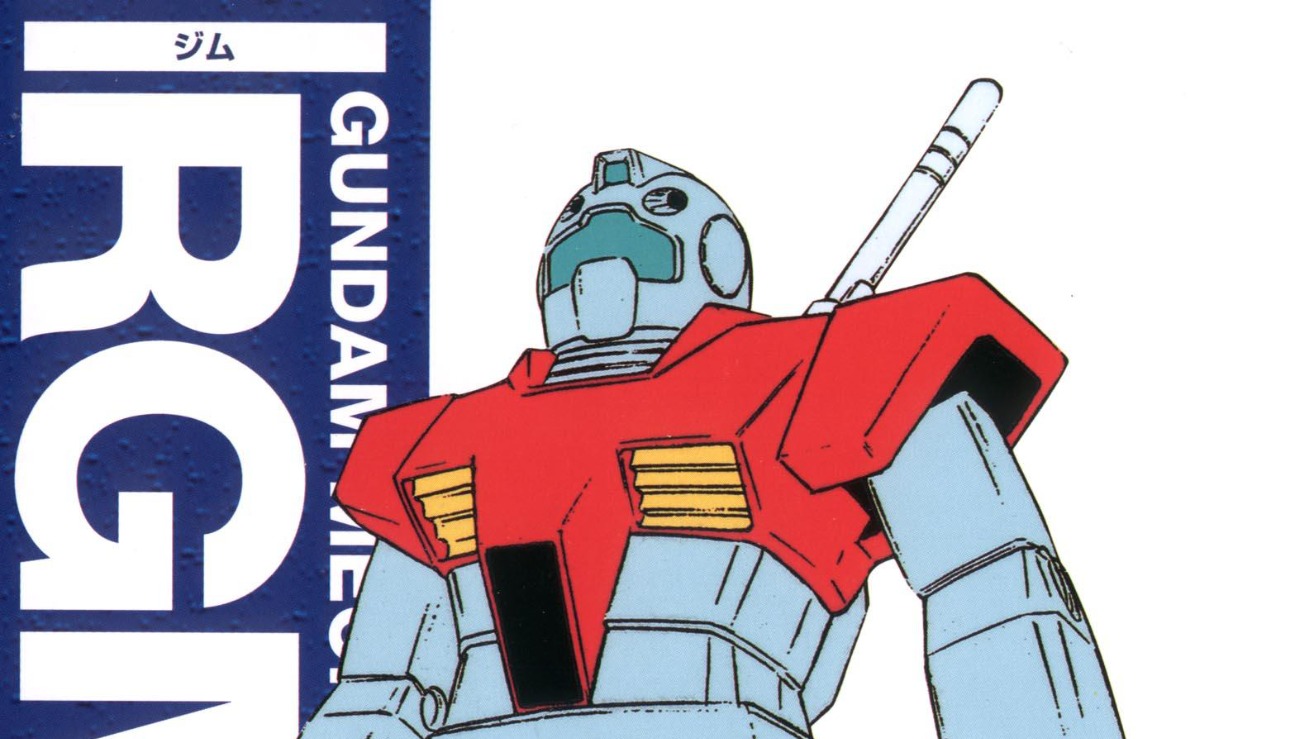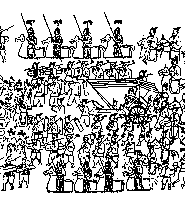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고대의 책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을까? 본문
짐순이는 천 권이 넘는 책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무슨 이데온만한 크기라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에이 19미터 밖에 안되는 왜소한 기체지요) 전부 PDF로 된 형태의 책입니다. MICRO-SD카드 한 장에 그게 다 들어가지요. 공자가 봤으면 짐순이는 현자중의 현자로 보일 겁니다. 다섯 수레 따위로는 그 책을 셀 수 없거든요.(삼국사기를 읽을 때 만나는 한문 덮인 그림도 삼국사기 PDF에서 따온 겁니다)
PDF가 아니라 E-PUB의 형태로도 많은 전자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서양 방식의 제책방법으로 만든 책을 기본형태라고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양장본이냐 반양장본이냐로 나뉘어 지지만 2017년 현재 지구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책의 형태이긴 합니다.
과거의 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선비가 책을 넘기는 광경 속의 그것이지요. 보통 활자로 안쇄할 때 양변인쇄가 불가능한 관계로 두 페이지분량을 인쇄한 후 반으로 접어 끈으로 묶지요. 이게 동아시아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형태의 책이 아주 오래전에도 사용되었다고 상상해도 무리가 없는 걸까요? 정말 이런 형태의 책만 존재하였던 걸까요? 고대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의 책을 읽었을까요? 고려시대라면 모를까 고대의 사람들은 이와 다른 형태의 책을 읽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그림 하나를 보지요.

삼국시대는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불경입니다. 설명이 없어 잘 모르겠지만 초조 어쩌구란 이름이 있눈 걸 보니 고려 현종 때 만들었다는 초조대장경의 인쇄본 중 하나일런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 문제는 해당 전공자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짜튼, 여러 장의 종이를 이어붙여 두루마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자세히 보면 종이를 붙인 경계선이 보입니다) 사극에서 의금부 도사가 "죄인 아무개는 들으라, 사약이 어쩌구저쩌구"라고 대사를 외면서 들고 있는 문서가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외국에 보내는 국서도 이런 모양이지요. 고대사 속의 사람들이 보았을 책의 모양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중기까지도 종이는 매우 비싼 것이어서, 사관들이 쓴 실록의 기본 자료인 사초도 1차 작업이 끝나고 강이나 개울에서 씻어서 재활용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웃 일본에서 겐지노노가따리를 쓴 무라카미 시키부도 누군가 종이를 한 다발 선물해서 그걸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한지를 많이 생산한 조선 중기 이후도 양대 출판 거점인 서울과 전주에서 춘향전을 책으로 낼 적에도 제지생산이 용이한 전주는 분량이 많은 반면에 수요가 공급을 늘 초과하던 서울에선 이른바 축약본을 냅니다. 조선시대 방각본을 공부하다 보면 경판본이냐 완판본이냐애 따라 이야기의 세밀함과 분량이 다른데 다 그런 하부구조적인 "에"로사항이 있었던 거죠.
종이가 많이 보급되지도 않던 시절의 책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책冊이라는 글자의 유래이기도 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이지요.

나무토막이나 대나무 줄기를 베어 가죽끈으로 엮어 책을 만듭니다. 보통 책을 너덜너덜하게 만든 것을 위편삼절이라 하는데 이 가죽끈을 세번 갈 정도로 읽어었다는 뜻입니다. 보통 군자는 다섯 수레의 책을 읽어야 한다고 할 때 이걸 다섯 수레에 채울 양입니다. 물론 춘추전국시대야 책 수가 적고 저 목간들도 부피와 무게가 많이 나가니 어찌어찌 수레에 채웠겠지요. 인천의 계양산성에서 발견된 논어의 경우 저런 목간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통일기 전후에는 두 번째 형태의 두루말이로 바뀌었겠지요.
'한국고대사이야기 > 자료로 보는 고대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2) | 2017.10.22 |
|---|---|
| 안악 3호분 행렬도에 대한 감상.. (0) | 2017.01.05 |
| 불고기랑 고구려 사이에 관련성은 하나도 없다. (0) | 2016.07.17 |
| 중국인이 읽으면 감격스러운데 한국인이 읽으면 찝찝한 글.. (0) | 2016.07.05 |
| 낙랑군 호구부로 본 한군현의 위치 (2) | 2016.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