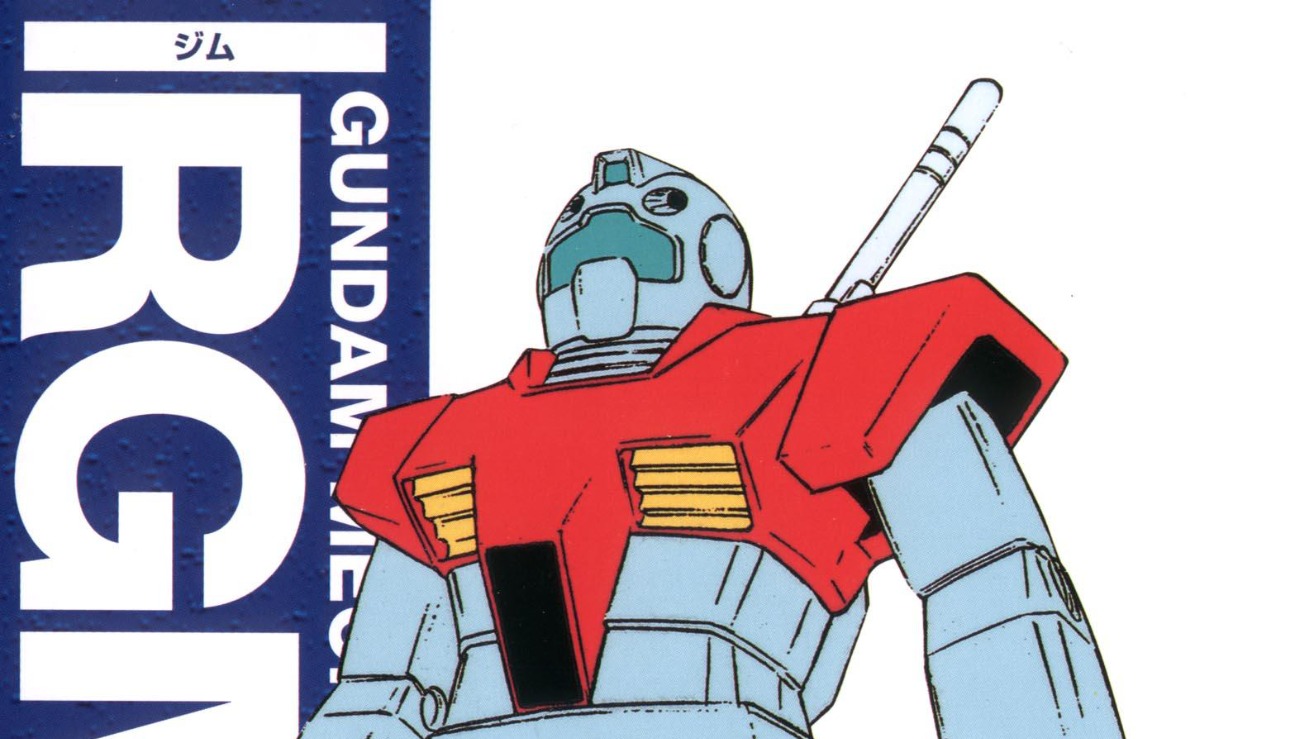RGM-79의 삼국사기 이야기
이론이나 숫자는 장식이다.. 본문
이렇게 제목달면 욕먹기 딱 좋다.
현실에서 이 연방의 폭죽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이론하고 숫자에 약해서잖아'라고 하겠지만
(그래, 수학은 운동부원들과 전교 상위권을 다퉜다. 총 틀린 갯수 중 절반이 수학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맞는 연구방법론이 귀납법이기도 하다. 이론으로 들이미는 거 질색이기도 하고)
숫자 자체가 정직하다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맞다. 숫자던, 통계던 그놈들은 정직하다.
다만 그걸 만지거나 해석하는 인간이 정직하지 않거나 멍청할 뿐이다.
그걸 이해하지 못할 때 파국이 온다.
이론 또한 그렇다. 어차피 현실을 해석하는 한가지 방법론인데
그게 현실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늘려지거나 잘려지는 일이 일어난다.
대공황 때의 일이다.
아들을 유명 경제학과에 보낸 음식점 사장이 있었는데, 공황에도 그의 집은 잘되었다.
방학이라 놀러온 아들이 그걸 보고 황당하다고 이래저래 훈수를 뒀다.
아버지는 똑똑한 아들이 잘배워 왔다며
식기를 값싼 걸로 바꾸고, 웨이트리스를 줄여 공황에 대비한 저비용 고효율 운영을 했다.
다음 방학 때 그 결과를 보러온 아들의 눈에 펼쳐진 건 뭐였을까?
파리만 날리는 음식점의 모습이었다.
이유? 간단하지.
그 누구도 똑같은 돈을 내고 더 줄어든 대접을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지.
누가 그걸 좋아하랴.
가끔 이론을 무기 삼는 사람들에게서 그 아들의 모습을 본다.
이론만으로는 아름답다. 정말 보고 듣는 것만으로 쾌락의 절정을 맛볼 정도로..

그러나 반대편의 삐딱한 머리로는 그걸 수긍할 수는 없다.
현장에선 도저히 안통하는 책상 위의 책략일 뿐이니까.
적어도 그걸 수시로 수정하지 못한다면 대한독립의 유공자 츠치 마사노부가 되는 거구..
역사의 해석에서도 무언가를 가정하고 사료를 접하면 무리한 해석이 나올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한 때 고려사 연구자들을 뒤흔들었던 관료제론이 그렇고
현재 고대사연구에서 일어나는 관료제론이 그렇다.
얼마전까지 삼국사기 직관지를 읽고 있었는데 그것만 봐도 참 아름다울 정도였다.
동시대 중국의 행정조직만큼은 아니어도 작고 세세한 영역까지 잘 짜여진 시스템!
그러나 그게 정말 스위스 시계처럼 매끈하게 돌아가는,
아니 적어도 지속력을 갖고 그럭저럭 돌아가는 체제였을까?
당육전같은 책만 봐도 체계적이다 못해 숨막힐 정도의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러나 그 책이 씌여진 건 당 현종, 딱 안사의 난이 벌어지기 전,
이미 당의 기본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온 시대이기도 하고.
일본만해도 율령국가니 뭐니 하며 자랑하지만 그건 일본의 토양을 전혀 의식치 않고
무리하게 당의 시스템을 이식하려한 행동이라 헤이안 중기부터 삐걱거렸다.
표면적으로는 관료제와 같은 뭔가로 움직인 것 같지만 속 내부로 들어가면 포장지만 바꾼 것이고..
(물론 그 잘난 서구 국가들이 이 정도의 시스템을 명목적으로라도 갖추는 건 먼 훗날의 일이다.
또 고려도 관료제가 아니라는데 통일신라가 관료제국가면
그야말로 5살에 애낳고 15살에 모유먹는 이야기, 아님 10살에 미적분하고 20살에 덧셈뺄셈 배우던가)
기반이라던가 하부구조라던가하는 것들, 뭐라고 부르던 간에
뭔가 확 바뀌지 않는다.
서류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듯하지만 현장은 그렇지 않다.
그저 지나간 일을 화두로 삼는 역사도 이런데
현실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이론이나 숫자를 하나의 방편으로
혹은 현실에서 나가야할 이정표 정도로 생각해야지
현실을 재단하는 절대기준이 되어선 딱 폴 포트가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수준의 일이 될 뿐이다.
책상에만 앉아서 뭐가 보이겠는가?
사실 숫자라던가 통계라던가 이론을 그다지 싫어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절대불가침따위를 싫어할 뿐이지..
'역사이야기 > 역사잡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역사연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8) | 2012.08.17 |
|---|---|
| 오늘의 나는 수라를 뛰어넘을 정도로 화가 나있다.. (17) | 2012.08.17 |
| 새로운 역사학, SNS역사학의 미래? (16) | 2012.08.05 |
| 대학원생 덤핑시대를 맞이하여.. (8) | 2012.08.02 |
| 녹슨 총보다 멋진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18) | 2012.07.29 |